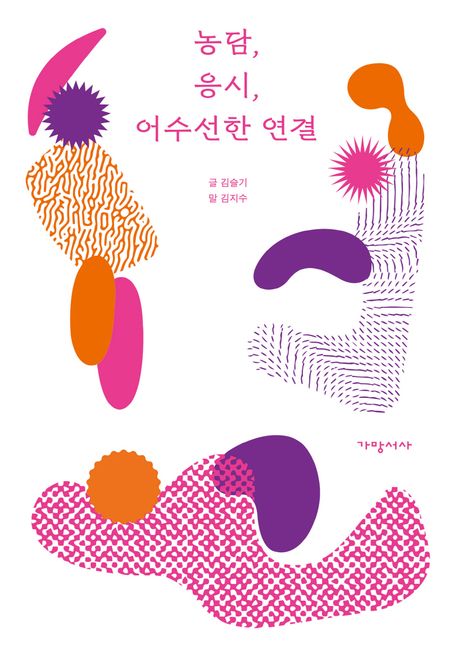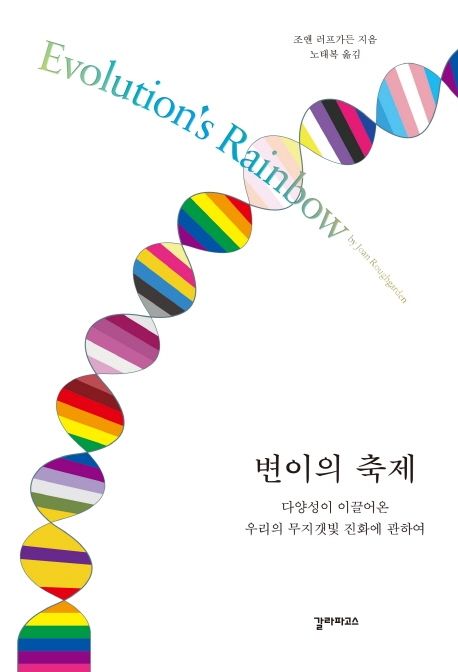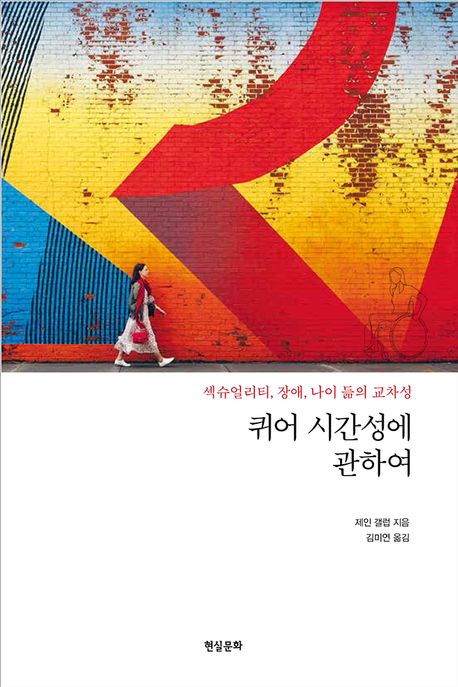
퀴어 시간성에 관하여 : 섹슈얼리티, 장애, 나이 듦의 교차성
- 지은이
- 제인 갤럽 지음 ; 김미연 옮김
- 출판사
- 현실문화
- 분류
- 사회과학
- 이 책이 소개된 컬렉션
- 알라딘 베스트셀러 - 사회과학 - 2024년 11월 2주차 알라딘 베스트셀러 - 사회과학 - 2024년 11월 1주차 알라딘 베스트셀러 - 사회과학 - 2024년 09월 1주차
- 책소개
-
생애 전체에 걸친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섹슈얼리티에서 시간적 차원은 어떤 의미를 함의하는가?나이가 들고 장애나 질병을 겪게 되는 일은 어쩌면 인간의 육신이 피할 수 없는 조건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그러한 경험을 겪게 되면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좀 더 일반적으로는 정체성에 대한 위협, 즉 현재의 우리, 지금까지의 우리 자신을 잃게 될지도 모를 위협을 받는다. 장애를 지닌 이들과 중년 혹은 노년에 접어드
...는 이들이 그러한 변화와 함께 이성애 중심주의, 비장애 중심주의의 경계를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될 때 그들은 섹슈얼리티 측면에서 비슷한 쟁점에 직면하게 된다. 무성적인(asexual) 존재이며 성적으로 열등하다고 가정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섹슈얼리티를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일은 평가 절하되기 마련이다. 그동안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퀴어 이론과 크립 이론을 교차적으로 사유하는 탁월한 성취를 거두었음에도 노화나 쇠퇴에 대한 이론적 성찰은 거의 간과되어 왔다. 그런데 장애와 노화를 위협으로 느끼는 상황은 ‘건강과 젊음’을 문화적으로 특권화하는 토대가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연장자를 성적으로 열등한 인간으로 가정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저자는 49세의 나이에 시작된 점진적 장애를 십 년 이상 겪으면서 장애와 노화를 둘러싼 섹슈얼리티를 교차적으로 사유해왔다. 이 책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이론화려는 지적 욕구의 성과로서, 섹슈얼리티와 장애의 그물망에 나이 듦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교차성 정치학을 통해 저자는 섹슈얼리티를 급진적이고 다양한 시간성으로 재개념화하면서 이성애 정상성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제안하고 있다.
출처: 은평구립도서관 도서 소개 및 네이버 도서 정보
- 네이버 블로그 후기
-